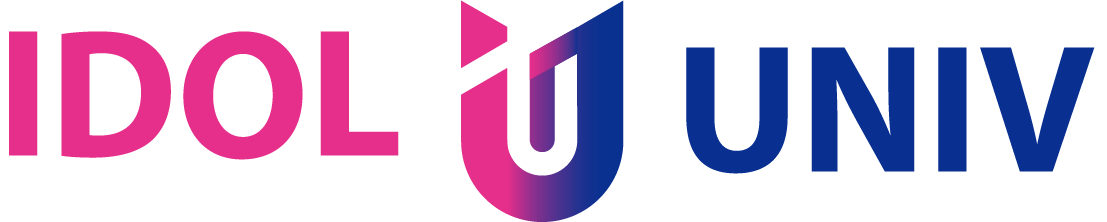칸영화제 메인 상영관은 영화를 발명한 뤼미에르 형제의 이름을 땄다.
약 2,500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뤼미에르 대극장에서는 매년 영화 거장들의 신작을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다. ‘월드 프리미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에 더없이 근사한 공간이다.
다만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극장인 만큼 멀티플렉스 극장처럼 편하지는 않다. 초대형 스크린과 끝없이 펼쳐진 좌석은 경이로움을 선사하지만 영화를 관람하기에 편안한 환경은 아니다. 좌석 사이 공간은 좁으며 뻗뻗한 등받이 역시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곳에 자리하는 영화인들은 모두 알고 있다. 편리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며, 불편한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뤼미에르가 다소 불편할지라도, 상징적 공간으로서 영화인들에게 선사하는 감동은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영화제 기간 이 공간을 찾은 관객들을 영화를 향한 충격과 감탄, 환호와 경이, 발견과 실망 등의 감정을 공유할 수 있다. 연륜있는 거장의 영화도, 패기 넘치는 신예의 영화도 뤼미에르 극장 안에서 쏟아지는 영화인들의 직설적인 반응을 피할 수 없다.
칸영화제는 역사와 전통을 중시하는 영화제다. 베니스영화제, 베를린영화제와 달리 칸은 오로지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영화만을 영화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도 OTT 영화들은 칸영화제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유는 과거와 같다. 2017년 봉준호 감독의 ‘옥자’와 노아 바움백 감독의 ‘더 마이어로위츠 스토리’가 경쟁 부문에 초청돼 프랑스 극장 연합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그들은 두 영화가 극장 상영을 전제로 한 영화가 아니라는 것과 개봉 영화는 3년이 지나야 스트리밍 서비스가 가능한 프랑스법에 위배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프랑스 극장업계와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칸영화제는 결국 “OTT는 영화가 아니다”라고 규정한 그들의 정의를 수용했다. 칸영화제는 그 다음해부터 지금까지 5년째 OTT 영화에 문을 걸어잠궜다.

OTT가 영화와 드라마 등 콘텐츠 업계에서 지각변동을 일으킨지도 수년째다. 영화는 극장이라는 공간이 선사하는 체험적 예술이라 믿었던 세계적인 거장들도 보다 좋은 제작 여건을 위해 잇따라 OTT와 손을 잡았다.
코로나19 시대에 들어서 사실상 영화 관람의 행태는 극장에서 안방으로 넘어갔다. 바이러스의 위험으로 인해 관객들은 극장을 외면했고, 대다수는 집에서 편안히 누워 리모컨 버튼 하나로 영화를 골라, 끊어보고, 넘겨보는 일상에 익숙해져 버렸다.
그러나 칸영화제는 일찌감치 OTT에 문을 걸어잠궜고, OTT 기업들 역시 자신들이 제작한 영화를 칸에 출품하지 않았다. 그 사이 베니스영화제는 2018년 넷플릭스 영화 ‘로마’에 황금사자상을 수여했고, 올해 미국 아카데미는 애플 TV+ 영화 ‘코다’에 작품상을 안겼다.
칸영화제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한 것일까. 아니면 영화의 전통적 가치를 계승하고 있는 것일까.

스트리밍 영화는 편리하고 편의적이다. 그러나 극장 영화의 불가항력적인 감동은 느끼기 어렵다. TV는 스크린보다 작고, 사운드는 극장의 그것을 능가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한 공간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영화를 관람하고 각자의 감상을 얻어가는 동시다발성의 미학을 선사하지 못한다.
봉준호 감독은 몇해 전 “스트리밍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극장의 위력을 당할 수 없다”고 단언하며 “영화관에 발을 들이면 영화가 관객을 통제하는 것과 달리 스트리밍으로 영화를 보면 관객이 영화를 통제한다는 점이 감독 입장에서는 안타깝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영화관은 감독이 만든 2시간의 리듬, 하나의 시간 덩어리를 존중해준다. 영화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극장이 소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를 딛고 3년 만에 정상 개최한 칸영화제에서 여전히 OTT 영화는 설자리가 없다.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한다는 사고는 구시대적일까. 영화의 도시, 칸을 수놓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서 반기를 들어본다.
‘OTT 없는 칸영화제가 어때서’
(연예뉴스 정은지 에디터)